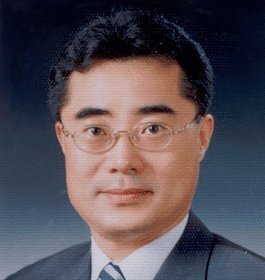
#A씨는 허리 통증을 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외상성 요추간판 파열’과 ‘마미신경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고 ‘심한 추간판 탈출증’과 하반신 마비 등의 후유장해 진단을 근거로 보험사에 총 85%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사는 사고의 외래성(외부적 요인)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의 진료기록지에는 “전날 오전 앉았다 일어나면서 허리 삐끗한 것 같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외관상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은 외관상 경미한 외부 요인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7월 23일 선고 2022가단5363037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노화로 인한 퇴행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사고에 의해 추간판에 압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요추 부위에 진단 및 치료 이력이 없었고, 응급실 초진기록지에 '전날 오전에 앉았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삐끗한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새벽에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고, (…) 원고에게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었으며, 위 장해에 대한 외상의 기여도가 50%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초진 기록지에 기재된 '앉았다 일어나면서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이라 볼 수 없고, 이 또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외관상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보이는 ‘허리 삐끗’이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경미한 외부 요인에 해당하는지였다.
판결 사안에서 원고는 삐끗한 다음날 새벽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고, 영상 자료 등을 통해 급성 파열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 이는 증상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법원은 의학적 소견을 통해 ‘허리 삐끗’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염좌가 아니라 중대한 상해를 유발한 원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에게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있었지만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외상(사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했다. 이는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부의 ‘삐끗’이라는 행위가 질병을 급성으로 발현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이다.
‘삐끗’이라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가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요하는 중대한 수술과 하지 마비 같은 영구장해를 초래했다는 점 또한 의학적 소견상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삐끗’이라는 행위와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중대한 결과 사이에 하루라는 짧은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처럼 사건과 증상 발현이 시간적으로 근접할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외관상 경미한 사고라도, 그 후 증상이 급성으로 나타나고 병원 진단까지 시간적 간격이 매우 가까울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환자는 증상과 사고 발생 시점을 명확히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진료기록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